엊그제 누군가와 만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한 기획 아닌 기획거리들이다.
배우 김혜자씨의 책 ‘꽃으로도 때리지 말라’도 그런 스스럼없는 수다에서 비롯되었다. 작년 어느 날, ‘전원일기’도 여러 해 전에 끝나고 문득 그녀의 행적이 궁금할 즈음, 누군가 신문에 난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를 꺼냈다. “그녀가 아프리카를 다닌 지 벌써 10년이 다되어간다는군. 참, 대단한 분이지? 틈틈이 일기를 써왔다는데, 책으로 내면 대박감이야.”
뭔가 정확하게 꽂히는 강한 예감이 있었고, ‘과연 내가 그분 책을 만들 수 있을까’ 내심 불안했지만, 결국 ‘용감한 도전자(나)는 미인(김혜자)을 얻었다.’
많은 필자들이 그렇지만 김혜자씨와 일하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다. 그분은 끊임없이 ‘왜?’를 물었고, 나는 계속 그 질문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.
이를테면 그분은 왜 자신이 책을 써야 하는지, 책 속에는 왜 그렇게나 많은 숫자와 통계수치가 필요한지, 왜 이 표현은 안 되고 저 단어가 든 표현이어야 하는지, 책을 냈으면 됐지 신문과 방송엔 뭣하러 나가 인터뷰해야 하는지, ‘셜리 발렌타인’을 공연할 때는 수많은 언론과 관객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는데 왜 책을 낸 필자로서의 자신은 서점에 나가 사인회와 독자와의 만남을 해야 하는지, 그것도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지방에까지 다녀야 하는지, 우리나라 서점의 강연장은 원래 그렇게 열악하고 분위기도 산만한지 등등.
업계에서는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져 설명이 필요없던 것들이 그분의 진지한 물음과 눈동자 앞에서는 나 자신마저도 왜 그래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됨은 물론, 그래서 곤혹스럽고 난처한 경우도 많았다. 더러는 어쩌자고 이분은 이렇게나 세상 물정을 모르실까, 이게 나 혼자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까다로우실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, 일단 당신 스스로 납득이 되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임했다.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북극성 같은 대스타가 된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였다.
반면 이미 숱한 책을 만들어봤다는 단순한 경력을 앞세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오만했던 나는 그럴 때마다 심하게 매를 맞는 것처럼 아팠다. 그저 경력이 많다는 것과 일을 잘한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나의 매너리즘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.
돌이켜 생각하면 그 갈등의 절정은 표지에 쓸 사진을 고를 때였다.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한 대부분 사람들이 비쩍 마른 아이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전형적인 표지용 사진(?)에 표를 던졌을 때 김혜자씨는 자신의 1인극 ‘셜리 발렌타인’의 포스터 사진을 강력 추천했다.
|
우리들 중 누가 봐도 표지용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한 설전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. 결과는 어쨌거나 그녀의 성공이었다. 원래 책이 잘 나가면 디자인도 잘된 것처럼 보이는 법이라고 애써 위로했지만, 그녀의 독특한 고집이 날 아프게 한 훌륭한 매가 되었음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./김이금 도서출판 열림원 주간 |  |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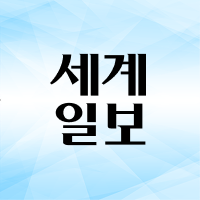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.jpg?type=nf190_130)






